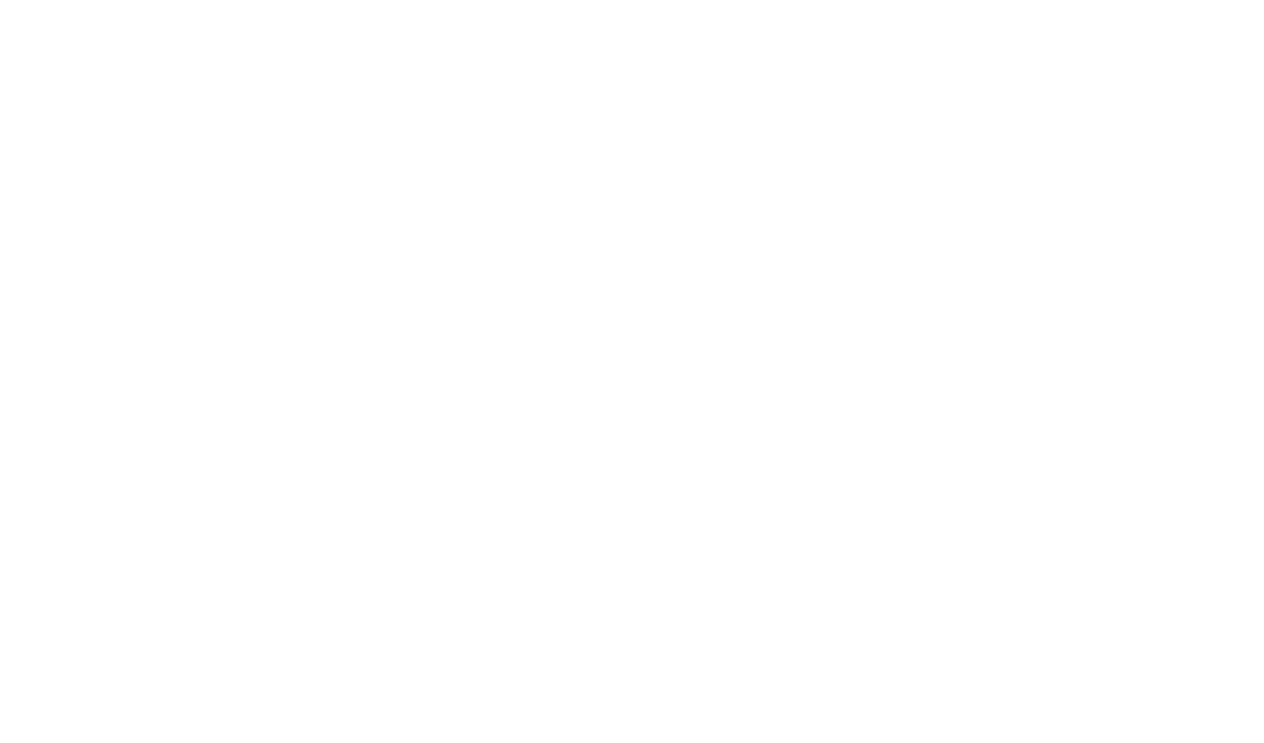술을 좋아하는 덕후이자 술쟁이, 태성으로부터
참여했던 두번째 시즌이 끝난지 2주쯤 지났을까. 앨린에게 문득 연락이 왔다. 두가지 제안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술을 마시자는 것, 하나는 술을 주제로 한 살롱을 해보는 게 어떻냐는 것이었다. 술은 달고 사니까 첫번째 제안에는 언제나 오케이였지만, 두번째 제안에는 음, 걱정이 앞섰다.
내가 술을 전문으로 하는 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 있는 덕후였기 때문에 각을 잡고 누구에게 알려주는 시간을 갖자는 제안은 무척이나 무겁게 다가왔다.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서 제안에 “아 좋죠!” 라고 후딱 대답은 해버렸지만 머릿속은 무척이나 복잡했다.
어떤 술을 소개할까 고민이 많았다. 예산적인 문제도 있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에 대한 문제였다. 술의 매력에 대해 확신과 믿음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는 처음이라 떨리기도 했다. 그래서 친한 바텐더들과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조언도 많이 구했다. 그러면서 공부도 많이 했다. 이걸 어떻게 깔끔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스크립트도 적었다.
하지만 정작 살롱이 시작이 되고 나서는 뭔가 일사천리였다. ‘들으려는 열린 사람과 많이 나누려고 열심인 사람.’ 둘은 참 궁합이 좋았다. 내가 술의 매력에 대해 운을 떼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그것에 답을 하고, 그렇게 주고 받는 과정이 무척이나 자연스러웠다. 위스키란 윤활유가 들어가서 그런지, 수다를 떨듯 자연스럽게 살롱이 흘러갔다. 예정된 두시간을 넘어 거의 세네시간 동안 시간 지나가는지도 모른채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살롱이 끝난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도 난 여전히 말이 참 많았다. 기분이 한껏 좋아진 채로 신이 가라앉지 않아서, 꽤나 오랫동안 가족에게 자랑을 했던 것 같다. 사람들의 순수한 호기심에 너무 좋았다는 말을 몇번이나 단어를 바꿔가며 이야기했다.
사실 나는 주류업계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술이 가지고 있는 맛과 향, 그리고 술이 만들어주는 일상의 풍요로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렇지만 가끔 내 안에 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나만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 술의 맛과 향들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직업으로 삼아도 될까.
그럴때마다 ‘아 그래, 이게 내 길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다잡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취향관에서의 살롱이 내게는 그런 순간이었다. 위스키와 칵테일을 마시며 멤버들이 즐거워하고 새로운 맛과 향에 놀라워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내가 갈 길이 맞구나’ 싶었다. 분명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 술을 좋아하는 덕후이자 술쟁이, 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