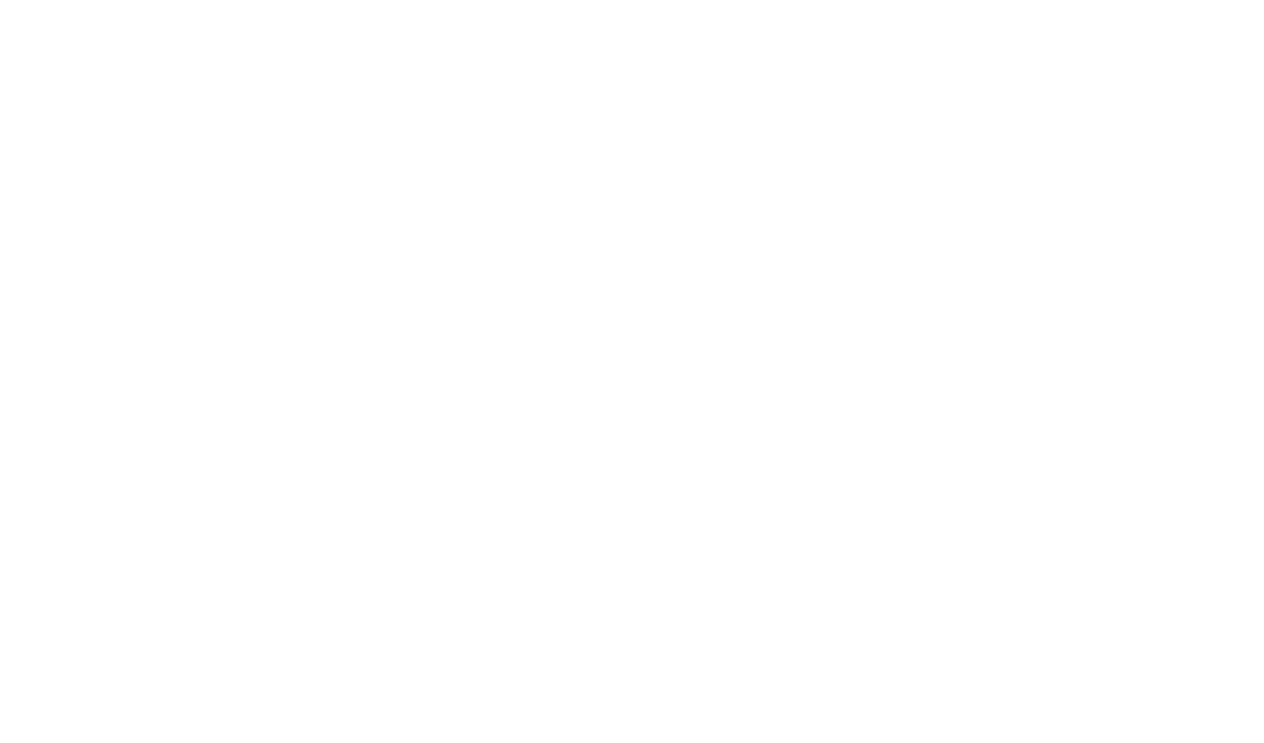우리는 이미 여기에 있었다.
비트겐슈타인의 추억
1889년에 태어나 1951년에 작고한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은 현대 최고의 철학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인물이죠. 스물 둘의 젊은 나이에 당대 최고의 논리철학자였던 러셀 앞에 나타나 천재로 인정을 받고 당대의 유명한 학자들과 교류하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며 3년 만에 케임브리지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 발발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도 집필을 이어나간 원고를 1921년에 <논리철학논고>로 출간하면서 “모든 철학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후 1929년에는 경제학자 케인즈도 그를 두고 “신이 왔다.”고 했으니 그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그의 책을 읽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모두 들어야 음악을 한다고 할 순 없듯이, 우리는 그들의 수혜자일 수는 있지만 그들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천재란 무엇인가’ 하는 규정에조차 이제는 많은 재해석과 해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언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흥미롭습니다. 저 역시 그의 어려운 책들을 제대로 읽어보지 조차 못했지만, 저에게 처음 ‘글을 쓰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가르쳤던 선생님부터 이따금씩 만나온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연구 희망’의 대상으로 거론되어왔다는 것은 ‘프랑켄슈타인’을 연상시키는 그 발음과, 소크라테스와는 또 다른 어떤 무게로서 계속 추억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논고는 “말할 수 있는 것(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로 시작하여 “세계는 일어나는 일들의 총체이다”라는 ‘당연한 말’을 지나, “일어나는 일, 즉 사실은 사태들의 존립이다”라는 점차 알 수 없는 규정으로 발전해갑니다. 그러다가 ‘숫자 7은 초록색이다’는 명제는 거짓이라기보다는 그에 대응한다고 할 만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nonsense) 명제이고, 윤리학과 미학의 명제들이 참, 거짓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이며, 그러한 명제들은 말하여질 수 없고 단지 보여 질 수 있을 뿐이라는 해석으로 치닫습니다. 결국 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새로운 ‘세계’
저는 이러한 그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의미’ 보다는 ‘반례가 존재하므로 거짓’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세계와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계와도 만나고 싶습니다. 때론 무의미해 보이는 명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새로운 ‘존립’으로 새롭게 치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요즘 그것은 좀 더 ‘믿음’에 가까운 무엇이 되고 있습니다.
4월 1일 “거짓부렁이 글쓰기” 시간과, 4월 7일에 있었던 “문장으로 일상담기” 첫 시간을 통해 느낀 바입니다. 두 번 다 오셨던 네 분은 무척 반가웠을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장난 섞인 딴지들과, 주거니 받거니 핑퐁을 즐기던 대화들 모두 환영입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자” 해놓고도 진실을 알려고 애썼던 우리의 모습들이나, 아직도 불분명한 어떤 사실들에 대해 우리는 관심이 남아 있습니다.
첫 날 “새빨간 사과”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 기만나님이 다시 만난 날, “생각하고 말면 잊어버리니까 그리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비유가 많아 때로는 저도 무슨 이야기를 정확히 쓰려고 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라고 했던 말이 ‘언어’의 속성을 무척 달달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말장난을 좋아하는 L.Y.의 느낌 있는 사진들과 재치 있는 말들, 밝은 에너지의 송진님이 가사를 쓴다고 하자 가사를 모으는 데에서 취향의 접점을 이야기한 서영님, 다시 그녀의 라디오 날씨 이야기가 MBC FM 91.9를 애청한다는 이야기로 넘어간 승엽님, 그리고 28일에 커피살롱을 열어줄 선행님과 각각 스테이크와 디저트로 접속한 은솔님 등... 일일이 기록하기엔 너무나 폭발적이었던 이 날의 ‘말’들은 ‘글’ 이전에 재미 그 자체였습니다. ‘술’과 ‘명함’, 그리고 ‘인맥’이라는 매커니즘과는 조금 다른 ‘낯선 사람들의’ 공동체를 느껴봅니다. 그 현장에 대해 “기존의 글쓰기보다 좀 더 자발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글쟁이’ 친구(이름을 밝히는 것이 비자발성으로 그를 몰아갈까 싶어 자체 엠바고 하겠습니다)에게 감사함을 표해둡니다.
다만 그녀의 옆에서 ‘자발적 원고’의 중요성에 대해 격한 공감을 표한 Allee님과, “처음에 생각했던 개념이 아니어서 더욱 즐겁다”며 함께 팟캐스트까지 제안한 Jake님과는 단톡방까지 만들었는데, 저는 이런 현상들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이미 알았던 것 같은 Alin의 통찰력에 혀를 내두릅니다. 이렇듯 즐거웠던 토요일의 만남은 제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수업’이나 ‘과제’의 영역으로부터 가뿐하게 벗어나 진정한 ‘일상’으로 남았습니다. 승엽님이 이야기했듯 “쿨한 사람이란 없”겠지만, 우린 좀 더 쿨하게, 지아님이 이야기하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했던 ‘솔직하고 뜨거운 비판의 단계’로까지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시 비트겐슈타인으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문득 5년 전, 강신주님이 엮은 <철학자, 철학을 말하다>를 열면 곧 만날 수 있는 두 조각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마찰이 없는 미끄러운 얼음판으로 잘못 들어섰던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 조건은 이상적인 것이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걸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마찰이 필요하다. 거친 땅으로 되돌아가자!”
이미지적인 그의 글이 참 좋군요. 저는 저 포효로부터 현대와 탈현대를 느낍니다. 제가 좋아하는 ‘뉴 저널리즘’ 역시 저 마찰의 힘으로 오늘도 새로운 원고와 육성을 뿜어내더군요. ‘말과 글’을 가지고 놀고, 또 그 위에 사회성을 한 겹 더 두텁게 입힐 줄 아는 이들이 있어 우리의 세계는 그다지 빈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기검열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곳이 오직 사다리를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 도달하려는 것을 포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가야만 하는 곳, 그곳에 나는 원래 이미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그래서 취향관에 이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